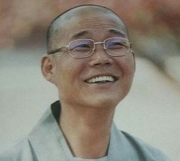
살다보면 존재의 가벼움으로 생(生)이 막 가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 산이 좋아 산에 살다보니 산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나는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다 보면 숲은 보이지 않는다. 숲을 이루는 건 나무다. 산에 산다지만 산 밑과 무관히 살 수 없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언제나 산은 울창한 숲으로 그 품을 내어주곤 한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이 <안녕, 잘 지내시나요?> 하고 묻는다. 마치, <밥은 먹고 다니냐?>. 산을 다시 오르려면 생전 어머니가 묻곤 하던 질문이었다. 무념무상이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물음을 던지는 고사목 하나에 눈을 준다. 나무는 그냥 나무였다. 그런데 내 눈을 찌르는 건 죽은 겨울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냥 스쳐 가면 되는데 나목(裸木)으로 인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이 내 마음을 끌었을까. 버티다 버티다 하늘을 향해 죽어버린 허공과 같은 존재였다. 온몸으로 망가진 채 서서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고독했지만 행복하였노라, 가질 것도 버릴 것도 없는 빈 손, 빈 몸. 더는 탕진할 게 없는 날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한 세월을 이겨낸 눈부신 이 아침 겨울에 선 채 봄을 기다리는 한 목숨이 거기 서 있었다. 평상시 그렇게 산을 올라도 눈에 띄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하는 일과 사랑, 그 소임 때문이리라. 멍청이 얼간이가 되어 한동안 나는 죽은 나무를 한참 올려다보았다. <잘 살고 계시나요, 스님?>하고 나무가 화두 하나 던지고 있었다.
전 생애를 바쳐 뿌리내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않고 기도하는 나무들. 한때, 살랑대며 무성하게 그 잎을 피우던 열정, 얼마나 고열에 추위에 시달렸을까. 그 욕망과 집착들. 핏빛 사랑. 나무들은 그렇게 분분히 나뭇잎을 떨굴 때도 사랑의 꿈을 꾸었을 것이다. 기나긴 꿈을 지나오는 동안 메마른 감정들. 비록 해와 달 바람과 구름에 버림받았지만 아직 다 으스러지지 않고 말라비틀어진 채 도대체 무슨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수행이었던가. 그랬다. 그 누구를 위한 헌신 희생도 아니었다. 그저 나는 지나가는 승려로 어쩌다 보아준 것 뿐 인데 마치 그 목숨을 다한 어머니, 나의 스승을 본 듯 멈춰 서서 가슴에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산다는 건 죄도 벌도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그렇게 젊은 날의 징표를 지워가며 빈 몸 빈털터리로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산다는 건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사형집행인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의 눈보라 추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묻는 거 같다. <그래, 우리들의 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가는 것이야.> 팔을 내밀던 가지들에 앉았던 새들, 함께 산을 지키고 숲을 지키던 안개와 별과 태양과 구름들. 그 깎이고 쓸렸던 사랑이야기들.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황홀하세요?> 라고 묻는 거 같다. 한동안 지옥과 같은 와선을 했던 적이 있다.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었다.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7차 8차 수술을 하고 집중치료실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겨 섭생하다 퇴원하기까지. 천천히 다시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겨울나무를 보았다. 한때, 새들이 앉았던 나뭇가지들, 가지는 바람에 부러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한때 새들이 앉아 지저귀던 그 체취도 사라진지 이미 오래. 많이 울었다. 그러나 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파할 뿐 징징거리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다리를 절룩이는 걸 모른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다. 좌슬에도 핀이 박혀 있고 우슬도 마찬가지다. 장거리 여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 오래된 사랑. 허공에 길을 잃은 저 고사목 한그루. 절룩이지만 절룩이지 않는 것이다. 우연은 없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연연해하지 않는다. 행복을 만드는것도 나고 불행을 만드는 것도 나였다.
아름다워라. 신비로운 그 자태 나무가 지나온 자국, 그 운명을 바라보고 나무가 내렸던 닻과 돛 앞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우리들의 생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답 없는 답. 그랬다. 내게도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 내게 주어진 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평생이라지만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죽어서도 그리운 그 무엇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다는 듯 고사목 하나, 그 순명을 받아들이는 나무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찬란히 새아침이라는 법어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